파리올림픽 '수박 겉핥기식 탄소중립' 비판…후원기업도 환경악당 지적
이동거리 늘어날 2030 FIFA 월드컵 …‘탄소중립' 문구 허위광고 의심"

지구의 마지막 경고선인 1.5℃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작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 높아졌다.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기온보다 1.5℃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자'는 뜻을 모은지 8년 만이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것이 무색할 만큼 온도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창간 9주년을 맞는 한스경제는 그간 천착해온 '1.5°C HOW' 캠페인에 맞춰 인류 생존 최후의 방어선인 1.5°C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부문별로 국내외 동향과 쟁점,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 연중기획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등 주요 스포츠 기구들은 204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OC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스포츠 기후행동 프레임워크(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FIFA도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FIFA 기후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줄이고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전 세계 축구 산업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규제, 탄소 배출 감소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들의 움직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전 세계 스포츠 행사 및 경기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친환경 스포츠 대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아직 멀기만 하다.
◆ IOC, ‘탄소 제로 올림픽’ 주장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2010년대 들어 올림픽의 탄소 배출량은 점점 증가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전 3개 대회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350만t으로, 각각 2012 런던 대회 약 330만t,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는 약 450만t을 배출했다. 유일하게 감소한 대회는 2020 도쿄 올림픽이었다. 도쿄 대회 당시 배출량은 약 293만t으로 줄었으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관중 수와 활동이 제한된 영향이 컸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 스포츠 행사로서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 올림픽’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막대한 탄소 배출이 수반되는 탓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전 세계 스포츠와 대중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배출량을 지난 3개 대회의 절반 이하, 배출량 약 175만t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개최지 파리는 지난 2015년 제1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 장소였기에 더욱 친환경 올림픽에 관한 열망이 컸다. 당시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1.5℃ 이하로 제한하려는 장기목표를 설정, 195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협약이다.

파리 올림픽은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했다. 새로운 경기장 건설은 단 한 곳이었고, 나머지는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1만2000명을 수용하는 선수촌은 나무와 저탄소 시멘트로 만들었다. 침대는 프레임을 골판지 재질로 설계하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 사용했다. 아울러 에어컨 대신 자연환기 기능과 선풍기를 사용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원할 경우 저공해 이동식 냉방 장치를 대여했다. 올림픽 기간에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고, 선수들과 대중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친환경을 표방하면서도 개회식에서는 내연기관 보트를 이용하는 등 파리 올림픽은 '수박 겉핥기식 탄소중립'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 서구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선수단에 에어컨을 공급했다. 파리 올림픽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활용했으나, 이 역시 비난에 시달렸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신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해당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심은 탓이다.
그린피스 역시 파리 올림픽 후원사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후원사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에어프랑스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친환경 올림픽과 연계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FIFA, 기후 전략까지 세웠지만... SLK “허위 광고 의심”
한 도시에서 한정적으로 열리는 올림픽과 달리, 국가 규모로 대회가 열리는 월드컵의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가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선수와 팬들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는 월드컵에 참가한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탄소 배출량은 늘어났다.
지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에는 약 280만t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이 배출의 주된 이유였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약 270만t의 배출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851만5767km²로 세계 5위의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지리 특성상 대부분 항공편에서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배출량이 약 200만t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가 된 대회는 ‘탄소 중립 월드컵’을 강조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카타르 월드컵의 탄소 배출량 추정치는 약 360만t에서 600만t에 이르고,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타르에서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월드컵에서 배출된 탄소는 아이슬란드의 연간 배출량(약 360만t)과 맞먹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7곳의 신규 경기장 건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에서 작동한 에어컨 등에서 비롯된 에너지 소비에서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다. 이는 기후 전략까지 발표한 FIFA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카타르에서 기록한 높은 배출량은 다음 대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많은 환경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 2026년 대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공동 개최로 열리면서 이동 거리가 더욱 길어졌다. 많은 전문가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확신하고 있다. 또한 2030년 대회도 3대륙(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6개국(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남미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각각 1경기)으로 확대되면서 FIFA의 기후 전략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매체 BBC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FIFA가 주장한 탄소 중립 월드컵 개최는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2030년 월드컵을 3개의 대륙으로 넓히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FIFA는 지난해 10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 거리가 짧아져 탄소 배출이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FIFA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2030 FIFA 월드컵의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101경기가 열리는 2030 월드컵은 국가 간 거리가 가깝고, 잘 발달한 광범위한 교통망과 인프라를 갖춘 이웃 국가들에서 치러질 것”이라면서 “월드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FIFA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의 스위스공정위원회(SLK)는 허위 광고를 의심했다. SLK는 “FIFA가 2026 월드컵을 ‘탄소 중립 월드컵’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문구는 유효하지 않다. 탄소 중립에 대한 근거를 전혀 들지 못했다. 허위 광고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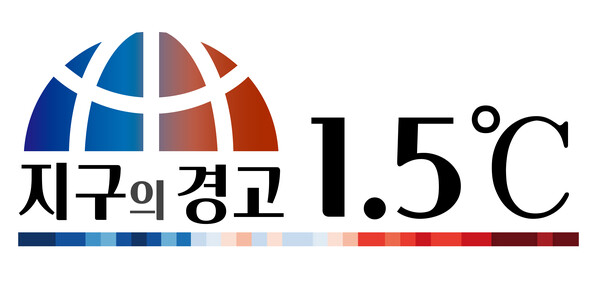
류정호 기자 ryutilit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