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인간 반작용의 변증법적 구조
AI 효율성과 인간 감성 결합한 홀스파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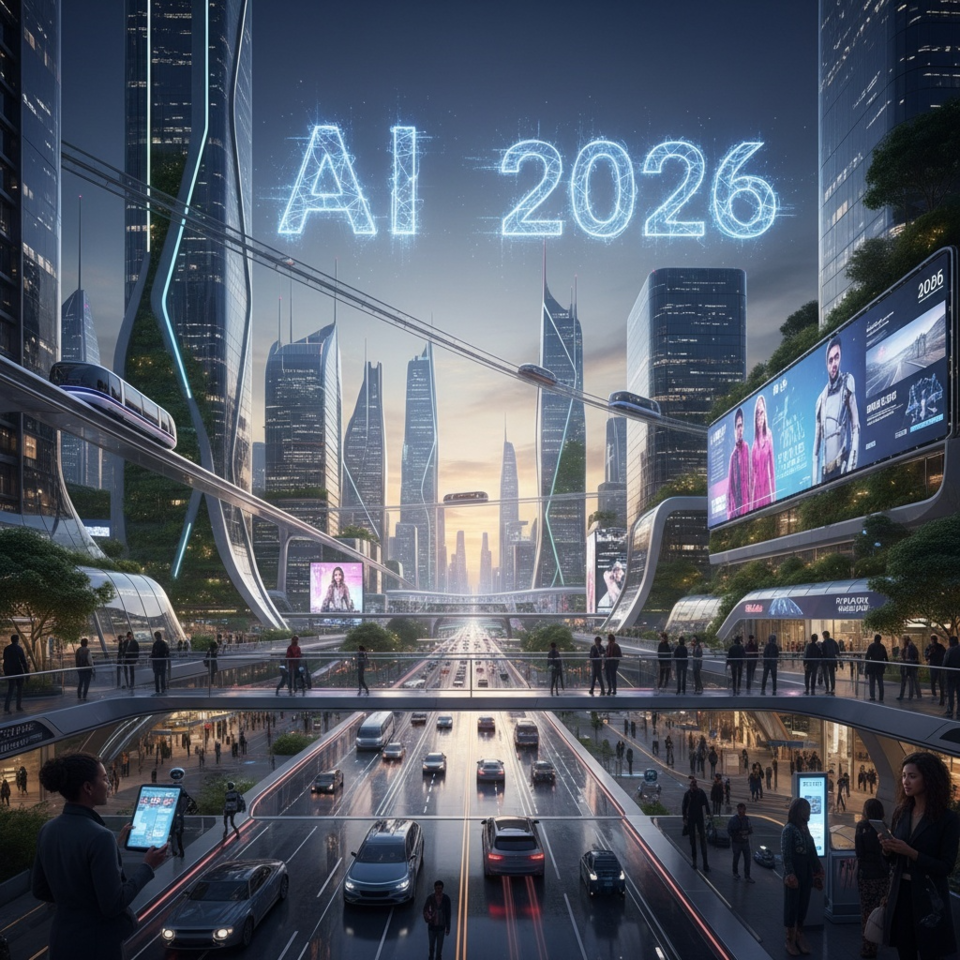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2026년 트렌드의 모든 키워드가 인공지능(AI)과 연결됐다. AI를 빼고 트렌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명예교수가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6' 출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019년간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온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었다. 2026년 10대 키워드 모두가 인공지능과 연결된 것이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을 맞아 '홀스파워(Horse Power)'라는 키워드로 압축한 이번 트렌드 분석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작용을 두 축으로 한 변증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 김 교수는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를 예로 들며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인간인 반인반마의 존재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하체는 AI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상체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성과 지혜를 겸비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키워드인 '휴먼인더루프(Human in the Loop)'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최소 한 번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이 여름 휴가철 추천 도서 15권을 소개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0권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책이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AI가 만들어낸 환각(hallucination)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AI를 활용하면 더욱 능력이 향상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며 "결국 AI 활용 능력과 함께 자신의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높으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키워드 '필코노미(Feel-conomy)'는 AI 시대의 역설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시대일수록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기분'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다"는 젊은 세대의 표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한 과시나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로클릭(Zero Click)' 현상은 AI가 유통과 마케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검색 후 여러 링크를 클릭해가며 정보를 찾았지만, 이제는 AI가 질문 한 번에 바로 답을 제시한다. 쇼핑에서도 AI가 개인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 과정이 극도로 단순화되고 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브랜딩이 중요했지만, 제로클릭 시대에는 브랜드보다 상품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전망했다. K뷰티 인디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브랜드는 약하지만 상품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디코어(Ready-core)' 트렌드는 젊은 세대의 철저한 준비 문화를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와는 달리, 현재의 젊은이들은 노션과 엑셀을 활용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다. 결혼 계획서를 엑셀로 만들어 상대방 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다.
AI 도입으로 조직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AX조직(AI Transformation Organization)' 개념도 주목할 만하다. 부서 간 경계(사일로)가 무너지고 직급 체계가 압축되면서, 임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실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교수는 "런(Learn)-언런(Unlearn)-리런(Relearn)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기존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셀라이프(Pixel Life)'는 현대 사회의 트렌드가 LCD 화면의 픽셀처럼 작고, 많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의미다. 유튜브가 '급상승' 동영상 카테고리를 없앤 것도 서브컬처가 너무 많아져 하나로 묶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철 음식, 팝업스토어 등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관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분석적으로 해부하는 '프라이스 디코딩(Price Decoding)' 현상도 두드러진다. 단순히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력의 값과 브랜드력의 값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듀프(Dupe)' 제품 - 브랜드는 없지만 비슷한 성능을 내는 상품 - 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건강지능(Health Quotient, HQ)' 키워드는 IQ, EQ에 이어 새로운 지능 개념을 제시한다. 25세 젊은이도 혈당을 체크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 AI를 통해 세계적 의료 논문을 찾아 읽으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건강 관리를 하는 '건강지능'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5가구' 개념은 1인 가구의 독립성과 다인 가구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혼자 살지만 외부 지원을 받는 '지원 의존형', 여러 명이 살지만 각자 독립성을 지키는 '독립 지향형',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시설 활용형'으로 나뉜다.
마지막 키워드인 '근본이즘(Fundamentalism)'은 AI 시대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급상승, 전통 공연에 대한 관심 증가, LG전자의 금성사 시절 가전제품 복각판 인기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이를 '아네모이아(Anemoia)' -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향수 - 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을 어릴 때부터 사용한 Z세대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60%는 디지털이 없던 시절에 대해 그리움을 느낀다"는 미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AI가 창조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진짜 근본'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26년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1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부여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겼던 유일한 승부에서 나온 78수가 가장 인간적인 수였다"며 "나만의 78수는 무엇인가, 가장 인간적인 수로 2026년을 헤쳐나갈 비책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챗GPT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사용자 2억 명을 돌파했고, 국내 기업들도 생성형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LG전자는 ThinQ AI를 앞세워 AI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유행하고, 레코드판과 필름카메라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추억의 도시락', 복고풍 디자인의 가전제품 인기도 마찬가지다.
김난도 교수가 분석한 키워드에 대해 한 마케팅 전문가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AX조직'과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는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귀띔했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